[음악이 있는 칼럼] 뉴욕타임즈를 살린 것은 콘텐츠였다 - 정현구 교수
2010년대 초반, 뉴욕타임즈는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16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 저명한 신문사는 디지털 혁명의 거센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광고 수익은 해마다 두 자릿수로 감소했고, 구독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2000년대 중반만 해도 건재해 보이던 신문 산업의 거인이 불과 몇 년 만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문제의 시작은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찾아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뉴스는 점차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아침 식탁에서 종이 신문을 펼쳐보지 않았다. 대신 컴퓨터 화면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뉴스를 접했다. 뉴욕타임즈도 처음에는 이런 흐름에 동참했다. 웹사이트를 만들고 기사를 무료로 제공했다. 독자들이 디지털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함께 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딜레마를 낳았다. 온라인 독자 수는 급증했지만, 수익은 따라오지 않았다. 온라인 광고 단가는 종이 신문 광고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설상가상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거대 플랫폼들이 디지털 광고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광고주들은 더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하고 더 많은 노출을 보장하는 이들 플랫폼으로 이동했다. 뉴욕타임즈의 전통적인 수익 모델이었던 광고는 붕괴 직전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광고 예산을 삭감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뉴욕타임즈의 광고 수익은 급락했다. 2009년, 회사는 본사 건물을 담보로 2억 5천만 달러를 대출받아야 했다. 직원 감축이 이어졌고, 베테랑 기자들이 회사를 떠났다. 한때 저널리즘의 상징이었던 뉴욕타임즈가 파산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다. 업계에서는 조만간 뉴욕타임즈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이 암울한 시기에 뉴욕타임즈 경영진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독자들은 왜 뉴욕타임즈를 찾는가?” 답은 명확했다. 바로 콘텐츠였다. 뉴욕타임즈가 160년 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건물이나 인쇄기 때문이 아니었다. 탁월한 저널리즘, 깊이 있는 취재,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때문이었다. 문제는 이 가치 있는 콘텐츠를 공짜로 나눠주고 있다는 점이었다.
2011년, 뉴욕타임즈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디지털 유료화 모델인 페이월을 도입한 것이다. 월 일정 횟수 이상 기사를 읽으려면 구독료를 내야 했다. 당시 이는 매우 논란이 많은 결정이었다. 무료에 익숙해진 독자들이 과연 돈을 낼까? 경쟁사들이 여전히 무료로 제공하는데 독자들이 떠나가지 않을까? 회의론자들은 이 시도가 뉴욕타임즈의 마지막 발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의 베팅은 콘텐츠의 품질에 있었다. 그들은 페이월 도입과 함께 오히려 콘텐츠 제작에 더 많은 투자를 시작했다. 탐사 보도팀을 강화하고, 데이터 저널리즘에 투자했으며,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형식을 개발했다. 2012년에 발표된 ‘Snow Fall’이라는 기사는 이런 노력의 결정체였다. 눈사태 사고를 다룬 이 기사는 텍스트, 사진, 비디오, 인터랙티브 그래픽을 완벽하게 결합해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경험을 제공했다. 이 기사는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디지털 저널리즘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뉴욕타임즈는 독자들이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가치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 단순히 사건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 그 사건의 배경과 맥락, 의미를 깊이 있게 파헤쳤다. 팩트체크 전담팀을 운영하며 거짓 정보와 싸웠고, 복잡한 이슈를 데이터로 시각화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 달 넘게 추적 취재하고, 수십 명을 인터뷰하고, 수백 페이지의 문서를 검토해서 만든 심층 기사들은 소셜 미디어의 속보나 클릭베이트 기사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결과는 놀라웠다. 처음에는 더디게 증가하던 디지털 구독자 수가 점차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했다. 2013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했고, 이후 매년 급증했다. 특히 2016년 미국 대선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은 전환점이 되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갈망했다. 뉴욕타임즈의 철저한 팩트체크와 깊이 있는 분석은 이런 갈증을 해소했다. 2017년 한 해에만 디지털 구독자가 100만 명 이상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또 한 번 뉴욕타임즈의 가치를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원했다. 뉴욕타임즈는 과학 기자들을 총동원해 바이러스의 작동 원리부터 백신 개발 과정, 정책의 효과까지 방대한 양의 고품질 콘텐츠를 쏟아냈다. 그해 말, 디지털 구독자는 700만 명을 넘어섰다.
뉴욕타임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콘텐츠의 영역을 뉴스 기사 너머로 확장하기 시작했다. 2017년에 시작한 팟캐스트 ‘The Daily’는 하루 주요 뉴스를 20분 안팎으로 깊이 있게 다뤄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요리 섹션은 별도의 앱으로 발전했고, 크로스워드 퍼즐과 게임도 독립적인 구독 상품이 되었다. 2022년에는 인기 단어 게임 Wordle을 인수하며 화제를 모았다. 다큐멘터리와 TV 시리즈 제작에도 진출했다.
이 모든 확장의 공통점은 품질에 대한 집착이었다. 뉴욕타임즈의 이름이 붙은 콘텐츠는 형태가 무엇이든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보장했다. 레시피 하나를 소개하더라도 수십 번의 테스트를 거쳤고, 게임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독자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고민했다. 뉴욕타임즈는 단순한 신문사에서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2024년 기준으로 뉴욕타임즈의 디지털 구독자는 1천만 명을 넘어섰고, 회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한때 회사를 짓누르던 빚은 모두 상환되었고, 직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광고 수익 의존도는 크게 낮아졌고, 구독 수익이 주요 수입원이 되었다. 파산 위기에 몰렸던 회사가 디지털 시대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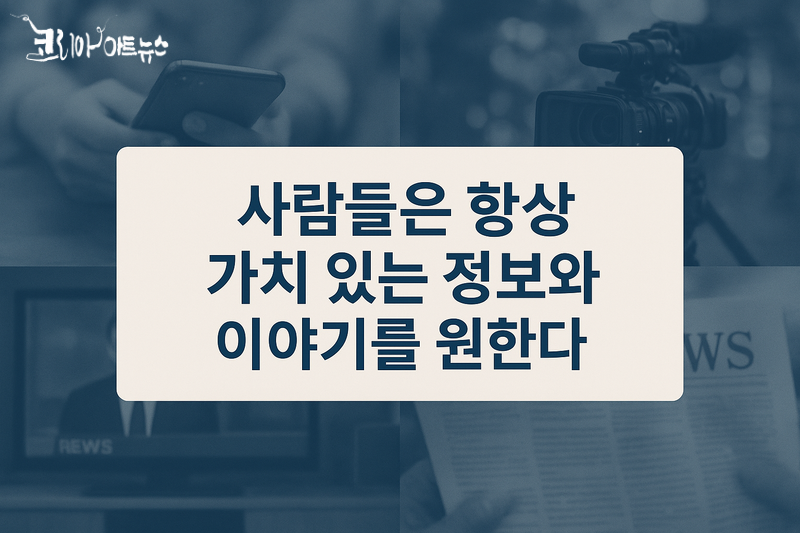
뉴욕타임즈의 성공은 디지털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보여준다. 결국 중요한 것은 콘텐츠의 품질이다. 플랫폼과 기술, 유통 방식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가치 있는 정보와 이야기를 원한다. 무료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뉴욕타임즈는 역설적인 진실을 증명했다. 정말 좋은 콘텐츠라면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즈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본질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화려한 웹사이트나 더 많은 클릭을 추구하는 대신, 더 나은 저널리즘을 추구했다. 더 많은 기사를 생산하는 대신, 더 깊이 있는 기사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독자들을 숫자로 보는 대신, 가치를 인정하고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고객으로 대했다.
이 여정은 모든 미디어 기업, 나아가 모든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기술과 플랫폼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알고리즘과 바이럴을 쫓기보다 독자와 시청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단기적인 클릭과 조회수보다 장기적인 신뢰와 충성도를 쌓아야 한다.
결국 콘텐츠가 왕이다. 이것이 뉴욕타임즈를 파산 위기에서 구하고 디지털 시대의 승자로 만든 핵심이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플랫폼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일 가치가 있는 뛰어난 콘텐츠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Farewell Across the Ocean | cinematic ballad inspired by “My Heart Will Go On” (Celine Dion)] - 음악을 들으며 칼럼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