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하의 하루에 시 한 편을 168] 임동확의 "별—서정주와 윤동주"
별
—서정주와 윤동주
임동확
한국현대시 1백년사 1915년생 미당 서정주와 1917년생 윤동주는 그들의 시 「한국성사략韓國星史略」과 「별 헤는 밤」을 통해 앞서거니 뒤서거니 혼돈의 시대를 건너가는 영원한 존재의 아날로지로 천공의 별을 자신들의 시 품 안으로 끌어들인 바 있는데,
문제는 어느 순간 아래에 머물러 있던 것이 위로, 위로 향하던 것이 아래로 바뀌면서 새로운 역사의 아이러니가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미당은 당돌하게도 개화 일본인이 허무로 도색해 놓은 별을 자신의 십이지장 속으로 끌어오고자 했으나 동주는 수줍게도 아스라이 먼 곳에 있는 그 별들은 그대로 놓아둔 채 바라보길 선택했다.
터진 장腸을 꿰매면서까지 붙잡아두려 했던 미당의 별은, 그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끝내 일탈하여, 오늘날 송학宋學 이후보다 더욱 먼 천공으로 건들건들 떠돌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에 그리움과 쓸쓸함과 부끄럼이 잔뜩 묻어 있던 동주의 별은, 가만 지상으로 내려와 지금도 자랑처럼 우리들 곁을 하늘하늘 스치우며 지나가고 있으리라.
—『부분은 전체보다 크다』(황금알, 2023)
[해설]
광복절에 읽는다 윤동주와 서정주를

광복을 6개월 앞둔 1945년 2월 16일, 윤동주는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교도소 독방에서 한밤중에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죽었다. 그의 시는 10종 정도 되는 검인정 국어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에 다 실려 있다. 심지어는 중국 연변의 조선어문 교과서에도, 일본의 검인정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 서정주는 2000년 크리스마스이브에 자택에서 숨을 거뒀을 때 만 85세였으니 천수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시는 어느 교과서에도 실려 있지 않다. 서정주를 생각하면 친일과 영원 같은 낱말이, 윤동주를 생각하면 애국과 희생 같은 낱말이 생각난다.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별을 노래했던 두 시인을 살펴본다.
서정주의 시 중에서 「한국성사략」은 1961년 12월 25일에 간행한 『신라초』에 실려 있다. 시의 전문은 이렇다.
천오백 년 내지 일천 년 전에는
금강산에 오르는 젊은이들을 위해
별은, 그 발밑에 내려와서 길을 쓸고 있었다.
그러나 宋學(송학) 이후, 그것은 다시 올라가서
추켜든 손보다 더 높은 데 자리하더니,
개화 일본인들이 와서 이 손과 별 사이를 허무로 도벽(塗壁)해 놓았다.
그것을 나는 단신으로 측근(側近)하여
내 체내의 광맥을 통해, 십이지장까지 이끌어갔으나
거기 끊어진 곳이 있었던가.
오늘 새벽에도 별은 또 거기서 일탈한다. 일탈했다가는 또 내려와 관류하고, 관류하다 간 또 거기 가서 일탈한다.
장(腸)을 또 꿰매야겠다.
이 시에 대해 이숭원은 “미당 자신은 단신으로 자연과 인간의 벽을 뚫고 하늘의 별을 자신의 내부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벌인다. ‘측근’이라는 말은 ‘바로 곁의 가까운 곳’이라는 뜻이 명사지만, 미당은 이 말을 동사로 활용하여 가까이 다가갔다는 말로 썼다. 하늘의 별 가까이 다가가 그것을 자신의 몸 안의 광맥을 통해 십이지장까지 끌어들였으나 어디 끊어진 곳이 있었는지 별은 자신의 내부에서 벗어나서 제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그것을 다시 붙잡아 자신의 체내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계속된다.”는 말로 설명하였다. 요컨대 별과의 일체됨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은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을 모르겠지만 이 시를 모르면 한국 사람이 아닐 것이다. 1941년 11월 5일에 쓴 이 시는 윤동주의 시 중에서도 최고 절창이다. 서울에 유학 와 있으니 북만주에 계신 어머니 생각도 나고 어릴 때 친구들 생각도 나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죽음에 대한 상념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와 일말의 희망을 가져본다.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라는 예감에서 우리는 불행 중에도 희망을 끈을 놓지 않으려는 동주의 끈기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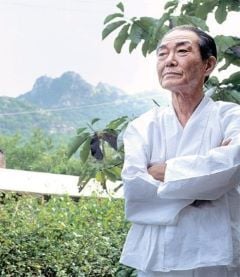
두 사람은 다 별을 노래하고 있는데 서정주의 별은 위풍당당하고 착실하다. 윤동주의 별은 수줍음을 많이 탄다. 임동확 시인은 비슷한 나이인 두 사람이 별이라는 같은 소재로 시를 썼는데 시의 내용과 겉모습이 확연히 다른 것에 주목하였다. 윤동주의 저항정신과 서정주의 신라정신도 달랐고 인생행로도 판이하게 달랐다. 그런데 서정주의 시가 교과서에서 몽땅 사라진 것은 잘못된 일이다. 공과 과를 함께 따지지 않고 어느 한쪽만 부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광복이 된 지 80년이 되는 오늘, 서정주에게 내려진 사형선고문을 철회하되 더욱 엄정한 평가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임동확 시인]
1959년 광주에서 태어나 전남대 국문과 및 같은 대학원, 서강대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했다. 1987년 시집 『매장시편』을 펴내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한신대 문예창작학과 명예교수이다. 독실한 천주교 집안의 둘째아들로 태어나 자식들에게 꾸지람 한 번 크게 하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무난한 아이로 성장했다. 다만 그 시절 유일하게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대학 입학 직전까지 자신이 시인이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시집으로 『살아있는 날들의 비망록』『운주사 가는 길』『벽을 문으로』『처음 사랑을 느꼈다』『나는 오래전에도 여기 있었다』『태초에 사랑이 있었다』『길은 한사코 길을 그리워한다』, 산문집으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누군가 간절히 나를 부를 때』『시는 기도다』, 시 해설집 『우린 모두 시인으로 태어났다』 등이 있다.
이승하 시인,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1984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1989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소설 당선
시집 『우리들의 유토피아』『욥의 슬픔을 아시나요』『생명에서 물건으로』『나무 앞에서의 기도』『생애를 낭송하다』『예수ㆍ폭력』『사람 사막』 등
평전 『청춘의 별을 헤다-윤동주』『최초의 신부 김대건』『마지막 선비 최익현』『진정한 자유인 공초 오상순』
지훈상, 시와시학상, 편운상, 가톨릭문학상, 유심작품상, 서울시문화상 등 수상
코리아아트뉴스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