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하의 하루에 시 한 편을 251] 윤현의 "상선약수"
상선약수
윤현
물은 색이 없다
하늘이 푸르면 물도 푸르고
하늘이 흐리면 물도 흐리다
시냇물도 강물도 바닷물도
손으로 아름 떠서 보면 모두
모두 색이 없다
물은 태가 없다
그릇에 담은 물은 그릇이 되고
꽃병에 담은 물은 꽃병이 된다
수돗물도 맹물도 약수도
어딘가에 담아보면 모두
모두 태가 없다
물은 뜻이 없다
위에서 떨어트리면 그저 떨어지고
옆에서 밀어트리면 그저 밀려난다
계곡물도 빗물도 호숫물도
가만 서서 바라보면 모두
모두 뜻이 없다
색이 없으니 색에 얽매이지 않고
태가 없으니 태에 구애받지 않으며
뜻이 없으니 뜻에 고통받지 않는다
물과 같아지고 싶다
물이 되어 흐르고만 싶다
―『시베리안 허스키』(도서출판 상상인, 2025)
[해설]
물의 자세를 본받으리
상선약수(上善若水)는 노자의 『도덕경』 제8장에 나오는 말이다. 원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최고로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좋게 하고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있으므로 도에 가깝다. 사는 데는 땅이 좋고, 마음에는 깊은 것이 좋고, 함께하는 데는 어진 것이 좋고, 말하는 데는 믿는 것이 좋고, 정치에는 다스리는 것이 좋고, 일은 할 수 있는 것이 좋고, 움직이는 데는 시기를 맞추는 것이 좋다. 무릇 다투지 않을 뿐이므로 탓할 것이 없다.”
물은 도통했다고 할까 득도했다고 할까, 만물을 좋게 하고 이롭게 하면서도 만물 중 어느 것과도 다투지 않는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험한 곳이거나 위태로운 곳에서도 자신의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니 해탈한 도인이나 선행을 일삼는 성인을 방불케 한다.
윤현 시인은 이런 물을 본받고 싶다고 한다. 물은 색이 없기 때문이란다. 확실한 색이 없다는 것은 현대에 와선 비난받을 일이지만 상대방의 색에 나를 맞추는 일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가. 공산주의가 왜 빨간색을 선호하는가. 피의 색깔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공산혁명을 생각하면 투쟁이나 쟁취 같은 낱말이 함께 떠오른다.
물은 태(態), 즉 모양이 없다고 한다. 영하로 내려가면 고체가 되고 섭씨 100도가 넘어가면 팔팔 끓지만 “그릇에 담은 물은 그릇이 되고/ 꽃병에 담은 물은 꽃병이 된다”. 나를 수용해주는 그 어느 것의 모양에 따르지 내가 타자(他者)라는 존재를 억압하지 않는다.
물은 자기주장을 하지 않는단다. 주장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뜻을 꺾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냐, 맞아, 그렇게 말할 뿐이다. 내 뜻을 관철하고자 남의 뜻을 꺾지 않기에 시인은 물을 가리켜 “뜻이 없다”고 하였다. 뜻이 없다고 해서 무의미가 아니고 수용하거나 적응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뜻이리라.
물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지금 이 세상에서는 맑은 물을 보기 어렵다. 내 어린 날의 김천 직지사 계곡물 같은 맑은 물을 마시고 싶다. 약품을 타지 않은 물,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지 않은 물이 없기에 암환자가 늘고 있는 게 아닐까. 마음을 비운다느니 욕심을 내려놓는다느니 말은 하기 쉽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윤현 시인의 “물과 같아지고 싶다/ 물이 되어 흐르고만 싶다”를 읽으니 나 또한 그러고 싶다. 다투지 않고 부드럽게 사는 것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최고의 처세술이라고 한 노자의 말씀이 백번 옳다.

[윤현 시인]
울진 출생으로 유년 시절에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를 몹시 좋아했다. 자라면서 체 게바라의 삶을 존경하게 되었고 소박한 자연을 사랑하게 되었다. 나무, 새 울음소리, 바람, 들국화…… 푸른 자유를 갈망한다. 시집으로 『시베리안 허스키』가 있다.
이승하 시인,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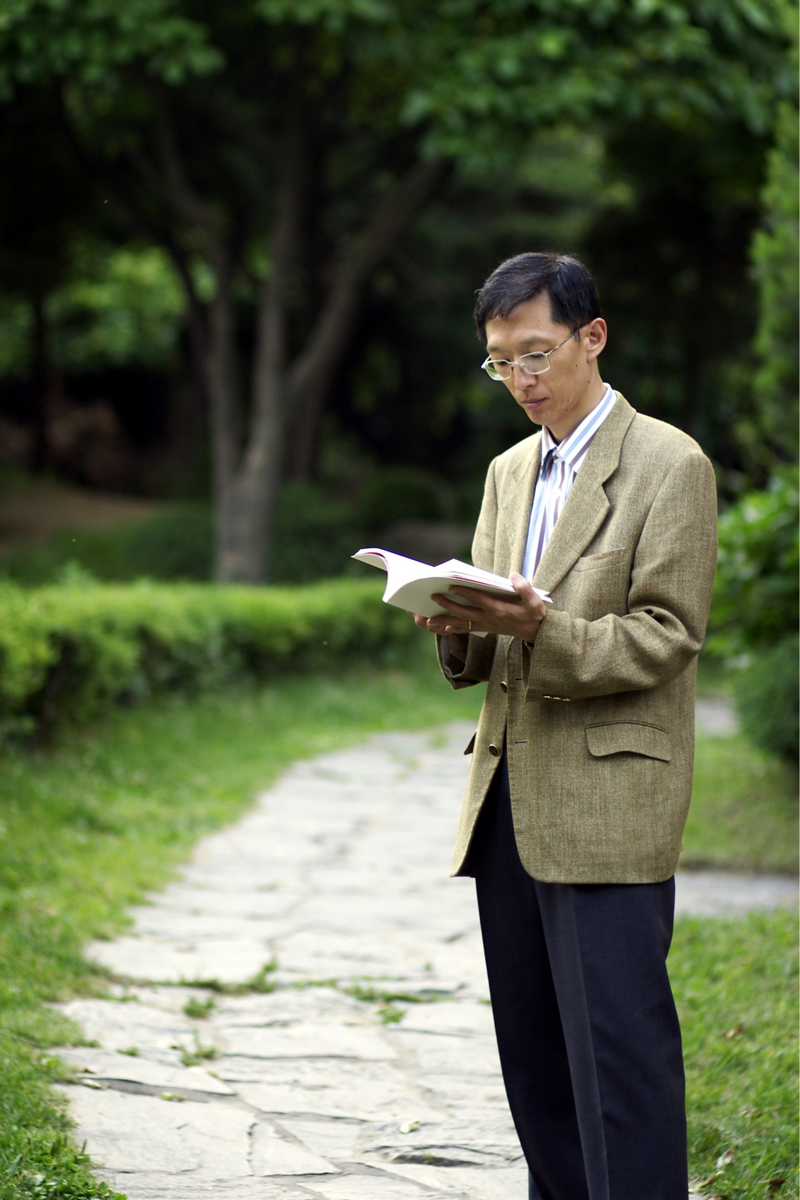
1984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1989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소설 당선
시집 『우리들의 유토피아』『욥의 슬픔을 아시나요』『생명에서 물건으로』『나무 앞에서의 기도』『생애를 낭송하다』『예수ㆍ폭력』『사람 사막』 등
평전 『청춘의 별을 헤다-윤동주』『최초의 신부 김대건』『마지막 선비 최익현』『진정한 자유인 공초 오상순』
지훈상, 시와시학상, 편운상, 가톨릭문학상, 유심작품상, 서울시문화상 등 수상
코리아아트뉴스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