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하의 하루에 시 한 편을 262] 이승하의 "할아버지 1" 외 1편
할아버지 1
이승하
병든 처가 기다리고 있다 달 아래 벗겨진 소나무
창칼 다시 들녘 끝에서 찾아와 나라가 무릎 꿇고
집으로 가는 길에 사람 하나 안 보인다 하메 올까
징병(徵兵) 나간 새신랑이 하메는 돌아올까 삽짝 앞에 서서
며늘아기 기다릴 집으로 가도, 반겨 주던 누렁이 죽고 없다
피땀 바친 쌀가마 죄 공출당한 이 마당에
그저 살다가 간, 그저 살다가 갈 누대의 천한 목숨과
평생을 다해도 갚을까 말까 하는 장리(長利) 빚이 부끄러워
고개 숙여 주재소에서 애비가 돌아간다 아들아
우야든동 살아만 오너라 풋바심하자 풋바심도 못하면
송기 벗겨 먹고 밀기울로 하루해 넘기고 이 질긴 목숨
애비가 비틀비틀 매 맞고 돌아가고 있다 이 정도야 괜찮다
우리가 심고 거두어들여 우리가 배불리 먹은 적 없는
삼남의 곡식들이 제 스스로 고개 숙이는 가을도 익어
이곳은 지금 한가위가 가깝다 달빛이 이렇게 좋다.

할아버지 2
집은 여기서 너무 멀구나 섣불리 못 돌아갈
고향 땅 내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누런 땅
부황 든 누님 얼굴 같은 그 땅의 그 누런 사람들
지금 다 무얼 하고 있을까 다 살아 있을까
논흙 떠다 쑥 버무려 쪄 먹던 보릿고개 생각난다
짙푸른 한여름 풍장 소리 들판 멀리 퍼지고
허리 아픈 가을 오면 다 빼앗겼다 참을 수 있느냐
그 땅에서 나 태어나 뛰어놀며 자랐으나
내 손으로 밭 일구고 논 갈아 살아가게 못하는
모진 시절이여 정든 땅의 정든 사람 다 뒤로 하고
밤 도망질, 이국에 와 막노동꾼 하루살이 행상에
툭 불거진 광대뼈 머리카락 어느새 반백이구나
아느냐 초가지붕 그해 이엉 못 이어도
함께 견디는 두렛일, 농악대 까불대며 뒤따르던 어린 날
그 땅의 그 사람들 지금 그곳에 남아
무얼 하며 살아가는지 다 살아 있는지 살아 돌아가야 하는데
몸이 몹시 아프다 뜻 하나 이루지를 못하고
견디어 왔다 견디어 왔다 내 이렇게 객사할 모양인가.
―『우리들의 유토피아』(새숲, 2020)

[자작시 해설]
오늘은 제86회 순국선열(殉國先烈)의 날입니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해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을 지칭합니다. 즉, 순국선열은 한국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생생하게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오늘 순국선열의 날은 그분들의 활동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현재화한다는 의미에서 광복절만큼이나 뜻깊은 날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그때 목숨을 잃은 분은 아니지만 황해도 해주군 취야장터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신홍윤 선생(애국장)과 미국 전략첩보국(OSS)의 냅코작전에 참여하여 활동한 최창수 선생(애족장), 여성으로서 중국 길림에서 ‘대한독립만세’ 혈서를 작성하여 독립의식을 고취한 박혜숙 선생(건국포장) 등 95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 시절에 국내에서 근근이 살아간 할아버지 한 분과 해외에 계시다 숨을 거둔 할아버지 한 분을 그렸습니다. 이분들은 뭐 썩 대단한 독립운동을 한 분이 아니라 장삼이사(張三李四)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파출소를 주재소(駐在所)라 불렀다 합니다. 그곳에 끌려가 흠씬 맞고 온 분이 한둘이었을까요. 아들이 징병이나 징용에 끌려가 생사도 알 수 없는 집이 전국에 수천 가구였을 겁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이역의 하늘 아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만주, 연해주 등으로 이주해 간 분들도 많았습니다. 상해임시정부의 요인이 되거나 독립군에 가담한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곳에서 광복의 날만 기다리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순국선열에 포함시킬 수는 없겠지만 재중국 조선인,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할린 동포들은 조국의 광복을 간절히 바라면서 숨을 거뒀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시를 써보았습니다.
1994년 8월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의 서대문 독립공원 안에 ‘순국선열추념탑’이 건립되었으며, 1997년 4월에 서대문 독립공원 내 독립관에 순국선열 위패 1,684위가 봉안되었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국립현충원에는 임시정부요인 묘역과 애국지사 묘역이 설치되어 관련자들 다수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1919년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39년 11월 21일에 임시의정원 제31회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殉國先烈共同記念日)’로 의결, 기념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1월 17일을 기념일로 택한 것은 1905년 11월 17일에 체결된 을사늑약의 치욕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승하 시인,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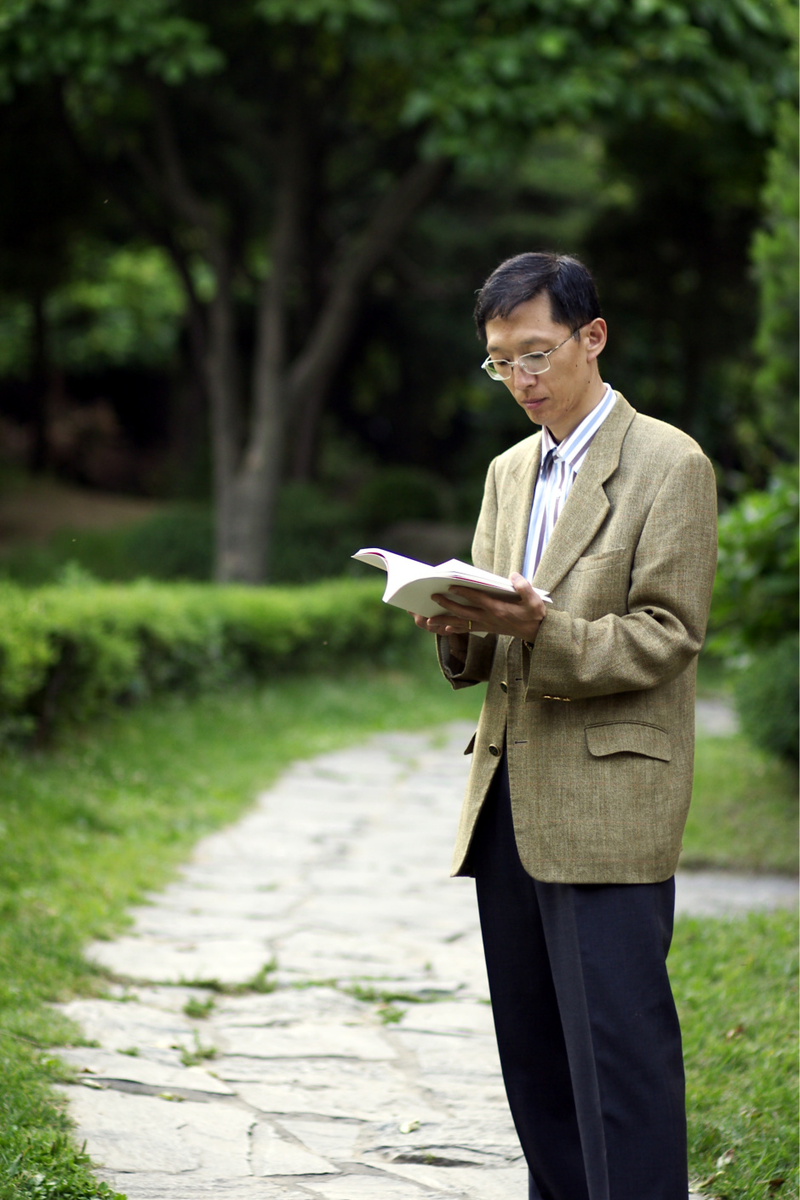
1984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1989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소설 당선
시집 『우리들의 유토피아』『욥의 슬픔을 아시나요』『생명에서 물건으로』『나무 앞에서의 기도』『생애를 낭송하다』『예수ㆍ폭력』『사람 사막』 등
평전 『윤동주-청춘의 별을 헤다』『최초의 신부 김대건』『마지막 선비 최익현』『진정한 자유인 공초 오상순』
지훈상, 시와시학상, 편운상, 가톨릭문학상, 유심작품상, 서울시문화상 등 수상
코리아아트뉴스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