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하의 하루에 시 한 편을 257] 송수권의 "퉁"
퉁*
송수권
벌교 참꼬막 집에 갔어요
꼬막 정식을 시켰지요
꼬막회, 꼬막탕, 꼬막구이, 꼬막전
그리고 삶은 꼬막 한 접시가 올라왔어요
남도 시인, 손톱으로 잘도 까먹는데
저는 젓가락으로 공깃돌 놀이하듯 굴리고만 있었지요
제삿날 밤 괴**
꼬막 보듯 하는군! 퉁을 맞았지요
손톱이 없으면 밥 퍼먹는 숟가락 몽댕이를
참고막 똥구멍으로 밀어 넣어 확 비틀래요
그래서 저도― 확, 비틀었지요
온 얼굴에 뻘물이 튀더라고요
그쪽 말로 하면 그 맛 한번 숭악하더라고요***
비열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도 남도 시인― 이 맛을 두고 그늘이
있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그늘 있는 맛, 그늘 있는 소리, 그늘
있는 삶, 그늘이 있는 사람
그게 진짜 곰삭은 삶이래요
현대시란 책상물림으로 퍼즐 게임하는 거 아니래요
그건 고양이가 제삿날 밤 참꼬막을 깔 줄 모르니
앞발로 어르며 공깃돌놀이 하는 거래요
詩도 그늘이 있는 詩를 쓰라고 또 퉁을 맞았지요.
* 퉁(꾸지람):퉁사리, 퉁사니 멋퉁이 등.
** 괴:고양이.
*** 숭악한 맛:깊은 맛.
―『퉁』(서정시학, 2013)

[해설]
전라도를 대표하는 시인 송수권
전라도의 구수한 사투리를, 특유의 풍습을, 수난의 역사를, 후한 인심을, 풍성한 먹거리를 멋진 가락으로 형상화한 시인이 송수권이다. 송수권 시인이 지인과 함께 벌교에 있는 참꼬막 집에 가서 꼬막 정식을 시켰을 때의 일이 시가 되었다. 전라도에는 ‘제삿날 밤 괴(고양이) 꼬막 보듯 한다’는 속담이 있는 모양이다. 화자가 잘 까서 먹지 못하고 서툰 솜씨로 꼬막을 굴리고만 있다가 남도의 지인 시인한테 퉁을 맞는다. ‘퉁바리맞다’의 준말이 ‘퉁맞다’인데 무엇을 말하다가 매몰스럽게 거절을 당한다는 뜻이다. 원래 ‘퉁’이란 품질이 낮은 놋쇠로, ‘퉁바리’란 이 퉁으로 만든 바리(놋쇠로 만든 여자의 밥그릇)이다.
아녀자의 밥그릇으로 얻어맞는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무엇을 말하다가 매몰스럽게 거절당하는 뜻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미있는 우리말임에 틀림없다. 화자는 퉁을 맞고 나서 시란 그늘이 있어야 한다는 충고를 또 듣는다. 남도 시인은 목포 출신 시인 김지하인 듯하다.
‘퉁’이란 이 시에서는 거절을 당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꾸지람이나 충고를 듣는다는 것쯤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남도 일원의 말은 이렇듯 사전적인 의미와 조금 다르기도 하다. ‘거시기’가 수많은 표현의 대유법으로 쓰이듯이 말이다.
송수권 시인은 퉁, 괴, 숭악한 맛 같은, 사전적인 의미에 머물 수 없는 우리말의 묘미를 이 시를 통해 독자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늘 있는 맛, 그늘 있는 소리, 그늘/ 있는 삶, 그늘이 있는 사람”이 “진짜 곰삭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해주기도 한다. ‘남도 사람’에게 들은 말이라고 하면서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늘’의 뜻은 김지하의 저작을 펼쳐보아야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송수권 시인에게는 생의 비극적 측면에 대한 따뜻한 연민의 정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송 시인은 이 시에서 현대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끝을 맺는다. “현대시란 책상물림으로 퍼즐 게임하는 거 아니래요”라는 말에는 현대시의 지나친 난해성에 대한 비난의 뜻이 담겨 있다. 많은 시인들이 책상머리에서 시를 쓰면서 퍼즐 게임을 유도하고 있는데 시인이 독자에게 퍼즐 게임을 시키면 곤란하다는 뜻이리라. 괴(고양이)가 제삿날 밤에 참꼬막을 앞발로 어르며 공깃돌놀이를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럼 안 된다는 것이다. 참꼬막을 잘 까야지 시인이 된다는 뜻이리라. 나는 이 구절을, 시인이란 말을 갖고 놀 줄 알아야 하고, 그 말놀음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또한 부채를 부치며 쉴 수 있게 그늘이 좀 있어야 하는데 독자가 진땀을 뻘뻘 흘리게 하면 안 된다는 말로 이해했다. 난해한 현대시들이 우리의 곰삭은 삶을 제대로 표현해내더냐고 이 시를 통해 은근히 충고해준 송수권 시인이 오늘따라 무척이나 그립다.
[송수권 시인]
1940년 전남 고흥에서 출생했으며, 순천사범을 거쳐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75년 《문학사상》으로 등단한 이래 『산문에 기대어』『꿈꾸는섬』『아도』『새야 새야 파랑새야』『수저통에 비치는 저녁노을』『파천무』 등의 시집을 냈다. 문공부예술상, 서라벌예술상, 소월시문학상, 정지용문학상, 김달진문학상, 영랑시문학상, 김삿갓문학상, 구상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순천대학교 교수를 역임했고 2016년에 별세하였다.
이승하 시인,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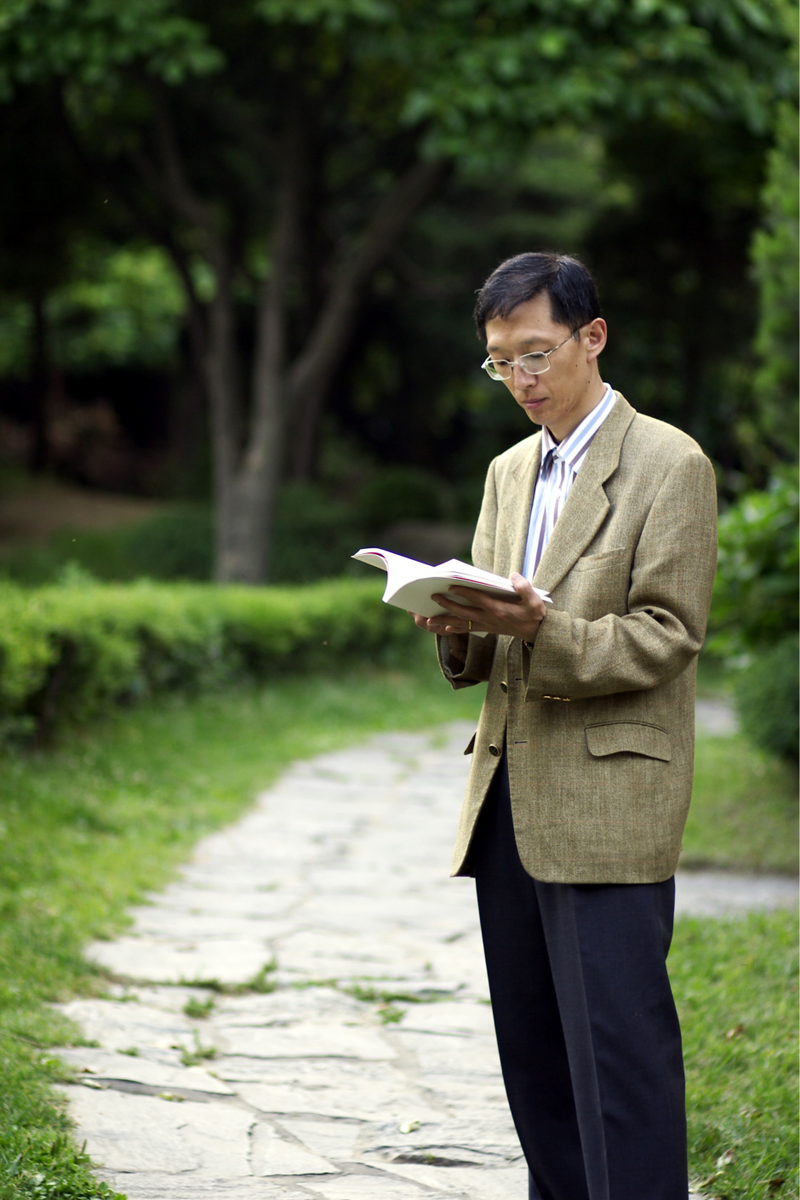
1984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1989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소설 당선
시집 『우리들의 유토피아』『욥의 슬픔을 아시나요』『생명에서 물건으로』『나무 앞에서의 기도』『생애를 낭송하다』『예수ㆍ폭력』『사람 사막』 등
평전 『윤동주-청춘의 별을 헤다』『최초의 신부 김대건』『마지막 선비 최익현』『진정한 자유인 공초 오상순』
지훈상, 시와시학상, 편운상, 가톨릭문학상, 유심작품상, 서울시문화상 등 수상
코리아아트뉴스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