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정답 자판기가 아니다, 당신의 '생각 파트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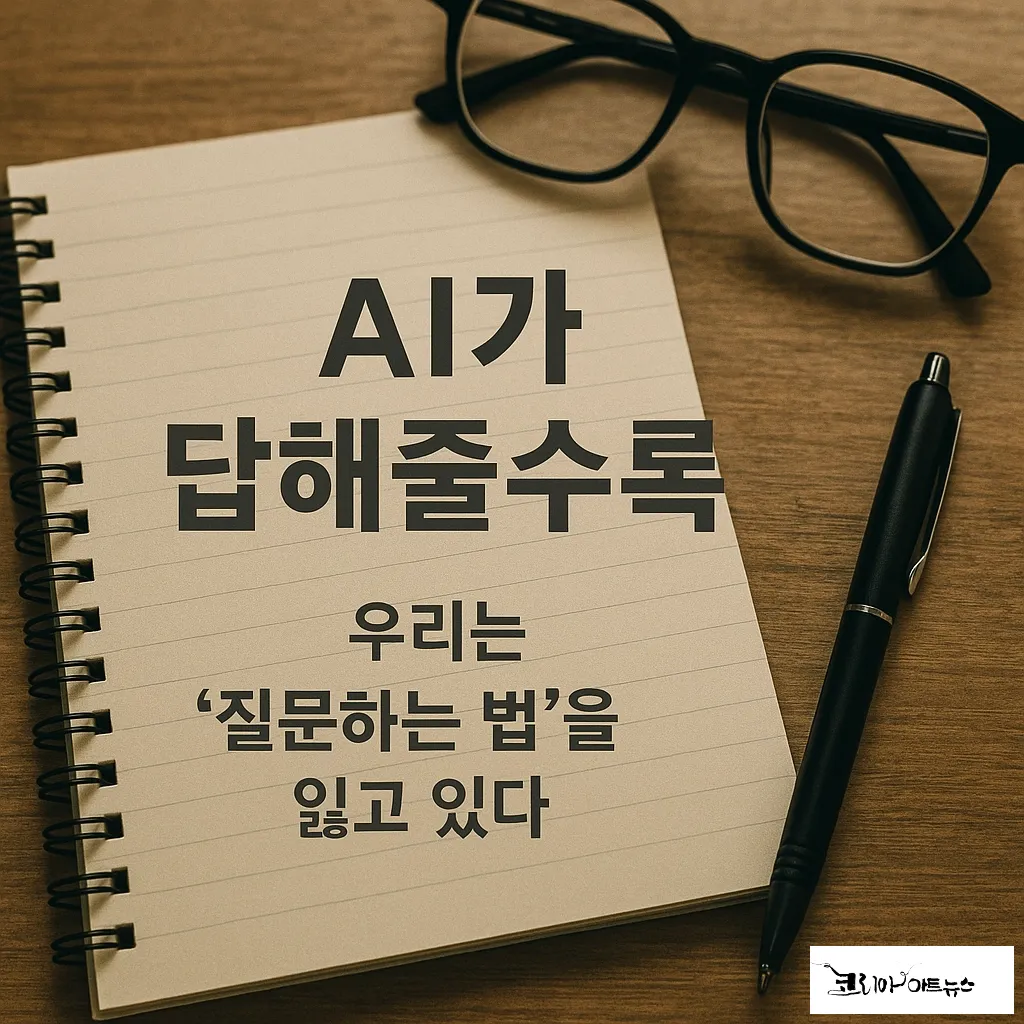
요즘 어딜 가나 AI 이야기다. 막히는 보고서의 첫 문장을 AI에게 부탁하고, 저녁 메뉴 추천을 받으며, 복잡한 코딩의 오류를 잡아내는 일은 더 이상 영화 속 장면이 아니다. 손안의 스마트폰이, 모니터 속 챗봇이 마치 마법 상자처럼 어떤 질문이든 척척 답을 내놓는다. 이 놀라운 편리함에 감탄하면서도, 문득 서늘한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과연 똑똑해지고 있는 걸까?
최근 동료 기자들과 대화하다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AI를 활용해 자료 조사를 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줄었지만, 기사의 깊이나 독창성이 그만큼 좋아졌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AI가 요약해준 자료, 그럴듯하게 정리해준 문장을 조합하다 보면 어느새 '나의 관점'과 '나의 질문'이 사라진 결과물만 남는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였다.
이는 비단 기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문맹(文盲)'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기서 문맹이란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다. 정답의 홍수 속에서 질문의 가치를 잊고,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생각의 근육'이 퇴화하는 상태를 말한다.
과거 계산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를 떠올려보자. 복잡한 셈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었지만, 계산기에만 의존하다 보면 간단한 암산조차 버거워지는 경험을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AI는 '생각의 계산기'와 같다. AI에 "마케팅 전략 알려줘"라고 모호하게 물으면, 교과서적인 답변만 돌아온다. 하지만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친환경 화장품 런칭 초기,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활용 바이럴 마케팅 전략 5가지는?"처럼 날카롭게 물으면, 비로소 쓸모있는 '단서'를 얻게 된다.
문제는 우리가 점점 후자처럼 질문하는 법을 잊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AI가 내놓은 첫 번째 답변을 최종 결과물로 착각하고, 더 깊이 파고들거나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을 멈춘다. 문제의 본질을 정의하고,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설계하는 과정이야말로 인간 지성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째로 AI에게 맡겨버리는 셈이다.
최근 IT 업계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이 주목받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AI로부터 최상의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질문 설계 능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는 방증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유의 방식에 대한 문제다.
우리는 AI를 '정답 자판기'가 아닌, 나의 지적 탐험을 돕는 '유능한 파트너'로 바라봐야 한다. AI가 내놓은 답변은 생각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그 답변을 바탕으로 "왜 그렇지?", "만약 다른 조건이라면?", "이 정보의 출처는 신뢰할 만한가?"와 같은 후속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비로소 AI는 우리의 지성을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인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오늘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 그리고 그 대답에, 또 다른 질문을 던졌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