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박사, 에너지 정책·산업·경영을 잇는 실천적 통찰서, 신간 『에너지에게 길을 묻다』 출간
정부의 조직개편과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신설로 에너지 정책 전환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 에너지 산업계의 오랜 실무 전문가인 정희용 박사(現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이사)가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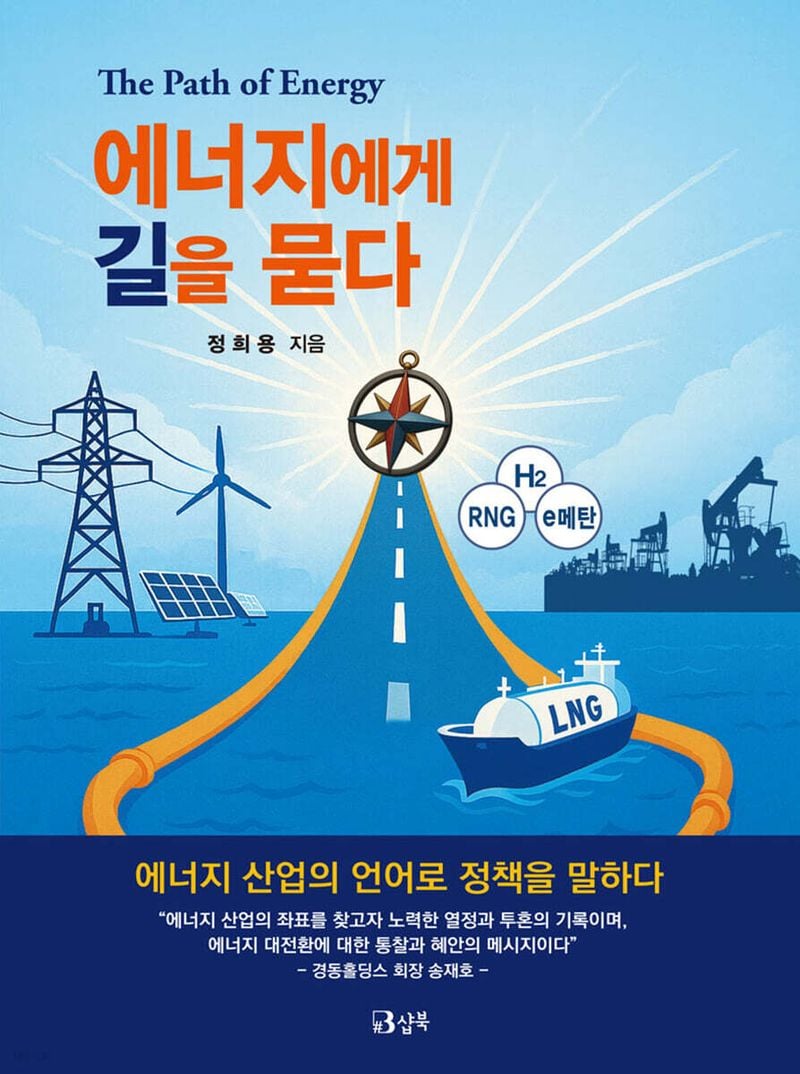
그의 신간 『에너지에게 길을 묻다(The Path of Energy)』(샵북, 2025년 9월 10일 발간)는 “앞으로의 에너지 산업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출발해, 정책과 현장을 잇는 실천적 해법을 모색한다.
정 박사는 현 정부의 에너지 행정 재편과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 시장 환경 속에서, 정책성과 현장성의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에너지 전환이 실현된다고 강조한다.
“에너지는 문명의 피” — 국가 경쟁력의 근본을 말하다
“에너지는 문명의 피와 같다. 그것이 흐르지 않으면 문명은 멈춘다.”
이 문장은 정희용 박사의 저서 전반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으로, 에너지를 단순한 산업 항목이 아닌 문명과 국가 시스템의 근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담고 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그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600억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 수입액에 주목하며, “에너지 안보는 결국 경제안보이며 산업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속화된 세계 에너지 공급 불안정 상황을 제시하며, “한국은 재생에너지·수소·e-메탄 등 신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자립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상적 담론이 아닌, 가정과 기업 그리고 국가의 생존 문제”로 표현한다.
정책과 현장의 언어를 잇는 실천적 제언
이번 저서의 큰 특징은 정책적 성찰과 산업 현장의 통찰을 결합했다는 점이다.
저자는 지난 30여 년간 에너지 산업의 변화 현장에서 정책 수립, 기업 경영 지원, 안전관리 혁신 등 다양한 영역을 경험해왔다.
그는 “에너지 산업의 언어를 정책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장마다 실행 가능한 대안과 개선 제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그는 ‘규제의 협곡을 넘어 진흥의 광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비유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의 핵심이 균형 잡힌 법·정책 시스템과 책임 있는 산업 구조에 있다고 강조한다.
“법은 정의를 말하고, 기술은 효율을 추구하지만, 산업은 책임을 말해야 한다. 정책은 정당해야 하지만 작동해야 한다.”
이러한 문장은 그가 오랜 정책 현장에서 체득한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AI 시대, ‘전력의 르네상스’를 대비해야
정 박사는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인류 문명을 움직이는 두 개의 바퀴”로 표현한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의 급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에너지 수급 구조의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50년 전력 수요가 2023년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사실을 인용하며, “결국 에너지를 가진 자가 미래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이제 에너지 정책은 기술 효율 중심에서 ‘산업 생태계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며, 산업계·학계·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실행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다.
■ 저자 약력

정희용 박사는 숭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전략 전공), 건국대학교에서 산업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에너지산업 실무 전문가로서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며, 한국가스학회 제14대 회장, 대학 강의 및 산업 안전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30여 년간 에너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오가며 300여 편의 칼럼과 기고를 발표했고, 이번 저서에는 그중 100편의 핵심 글이 엮였다.
그는 “우리가 던져야 할 것은 정답이 아닌 올바른 질문”이라며, “『에너지에게 길을 묻다』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