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하의 하루에 시 한 편을 186] 박희곤의 "수술, 끝나지 않은"
수술, 끝나지 않은
박희곤
임파선까지 전이된 악성종양을 제거하지 못하고
개복한 배를 닫고 수술방을 나왔다
적황색 신생 암 덩어리 촉감은
손을 씻어도 머릿속에 박혀 화석이 되었다
젊은 환자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기억의 여울목에 흘러내리던 출혈
이어주지 못한 목숨줄
수술복을 적신 핏물이 마르고
- 환자분 수술은 잘 되었으니 내일 퇴원하세요
희망은 절망을 보내는 신호일 뿐
쉿, 그의 아내가 집게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댄다
수술실 창 너머로 경광등이 번쩍이고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않는 세상
구급차, 혼자 곡을 하며 달려간다
—『무연고 사회학』(문학의전당,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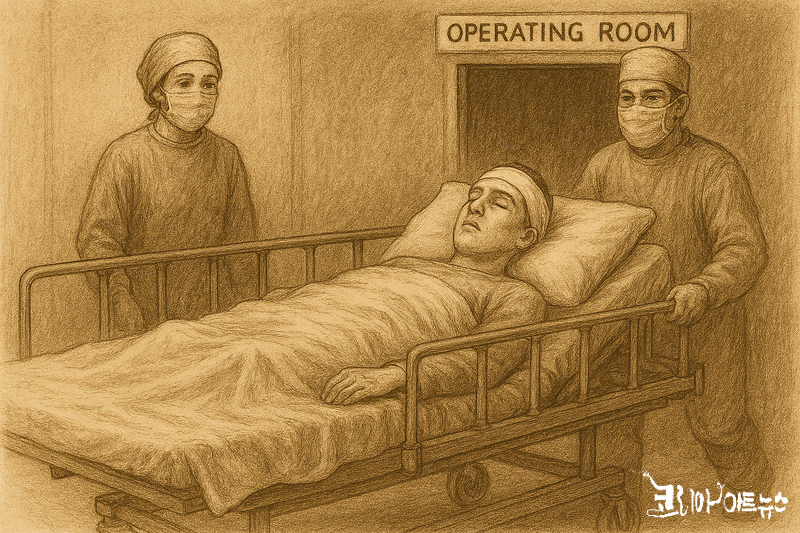
[해설]
수술을 해서 산다면
이 시의 화자는 환자의 배를 열어 악성종양 제거 수술을 하려고 한 집도의이다. 그런데 종양은 이미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어 있어서 종양을 제거하지 못하였고, 놀란 집도의는 개복한 배를 그대로 닫고 말았다. 손을 씻어도 적황색 신생 암 덩어리의 촉감이 잊히지 않아 암 덩어리가 뇌리에 박혀 화석이 되었다니 얼마나 끔찍한 모양이었을까.
의사는 환자의 목숨줄을 이어주지 못했다. 작대기 뒤의 말 “환자분 수술은 잘 되었으니 내일 퇴원하세요”는 상상 속의 말이다. 남편의 죽음을 인지한 아내는 의사가 이런 거짓말을 한다면 집게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는 것으로 ‘닥치시오’라는 말을 대신했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는 장례식장에서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 환자가 막 임종했을 때는 가족이 울음을 터뜨렸겠지만 장례식을 치르면서 손님을 계속 맞이해야 하고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인에 대한 생각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손님들도 마찬가지다. 고인과 인연이 있기에 장례식장에 왔지만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의 대화가 마냥 즐겁다. 그래서 “구급차, 혼자 곡을 하며 달려간다”는 상징적인 결구가 의미심장하다. 죽어도 아무도 울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오직 고통만이 환자 자신의 고통이었다. 어느 누구의 죽음인들 죽음 이후에는 대체로 나 몰라라 하는 이 비정한 세상을 시인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 시를 쓴 박희곤 시인은 병원에서 오랫동안 심장 수술을 위한 체외순환사로 근무하였다. 체외순환사는 환자의 심장과 폐 기능을 대신하는 장비(인공심폐기, 에크모 등)를 운용하며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 즉, 인공장비가 심장과 폐 대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전문인력이다. 수술이 이뤄지는 내내 환자의 혈압, 체온, 혈액의 산소포화도 등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며 수술팀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변화에 즉각 대응한다. 모교인 부산대학 대학병원의 흉부외과에서 일하다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에서 정년퇴임했다. 직접 메스를 들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수술에 참여한 분이다.
[박희곤 시인]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부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인제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를 졸업했다. 마산대학교 겸임교수, 대구보건대학, 양산동원대학 외래교수 역임. 2023년 <매일신문> 시니어문학상에 시가, 2025년 <매일신문> 시니어문학상에 수필이 당선되었다. 저서로 『체외 순환론』 『에크모의 이론과 실제』 외 다수가 있다.
이승하 시인,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1984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1989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소설 당선
시집 『우리들의 유토피아』『욥의 슬픔을 아시나요』『생명에서 물건으로』『나무 앞에서의 기도』『생애를 낭송하다』『예수ㆍ폭력』『사람 사막』 등
평전 『청춘의 별을 헤다-윤동주』『최초의 신부 김대건』『마지막 선비 최익현』『진정한 자유인 공초 오상순』
지훈상, 시와시학상, 편운상, 가톨릭문학상, 유심작품상, 서울시문화상 등 수상
코리아아트뉴스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