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칼보다 문화, 가장 조용한 지배
말보다 깊고, 글보다 넓고, 힘보다 오래 남는 것
500년을 설계한 철학
“사상으로 다스리고, 질서로 남긴 나라”
조선은 선비의 나라였다. 무사가 지배층이던 일본의 사무라이, 유럽의 기사와 달리, 조선에서는 학자가 정치를 이끌었다. 힘보다는 이성과 윤리가 우선했고, 통치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철학적 질서 위에 놓였다. 조선은 사상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그것을 통해 나라를 운영한 보기 드문 체제였다. 그렇게 철학에서 시작된 질서는 정치와 행정으로 이어졌고, 오랜 시간 국가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조선을 국권을 잃고 역사에서 사라진 ‘망한 나라’로 기억하기도 한다. 하지만 조선사와 왕실 연구에 깊이를 더해온 역사학자 신채용의 『조선왕실의 백년손님』이나 『우물 밖의 개구리가 보는 한국사』 같은 저작을 보면, 조선은 세계사에서도 드물게 오랫동안 이어진, 사상과 제도가 조화를 이룬 품격 있는 국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조선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은 국경을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다.
하버드대 마크 피터슨 박사는 조선을, 선비들이 철학을 삶으로 옮기고 그 정신을 제도로 구현한 드문 국가로 정의한다. 그것은 조선이 사유와 질서를 바탕으로 문화를 구축한 나라였기 때문이고, 사상과 윤리가 국가의 형식이자 지속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드문 사례이기 때문이다.

힘, 말, 글, 그리고 문화
“사람을 설득하고 시대를 바꾸는 것”
사람을 설득하는 힘에는 깊이와 넓이가 있다. 힘은 소수를 제압하고, 말은 그 범위를 넘어 설득하며, 글은 시간까지 아울러 감화시킨다. 그리고 문화는 그 모든 것을 넘어 시대의 사상을 견인한다.

근대에 이르러 백범 김구는 그 마지막 단계를 바라보았다. 그는 『백범일지』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문화가 힘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에게 문화는 전쟁보다 강한 평화의 기술이었고, 생존을 넘어 존엄으로 가는 방편이었다.
프랑스의 정치가 앙드레 말로는 문화를 한 나라의 정체성과 생명력을 지탱하는 힘으로 보았고, 국제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는 문화가 군사력보다 깊고 넓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문화가 가지는 힘을 정밀하게 짚은 통찰이다. 모든 것이 빠르게 번지고 사라지는 시대에서, 가장 멀리 가고 오래 남는 것은 결국 문화다. 말보다 깊고, 글보다 넓고, 힘보다 강하다. 그것이 문화가 가진 진짜 힘이다.
다음 세대에 건넬 문화
다음을 준비하는 기술, 미래를 설계하는 힘
오늘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산업화를 이룬 나라 중 하나다. 진정한 영향력이 드러난 순간은 BTS의 노래와 기생충의 서사, 김치와 한글의 품격이 전해졌을 때였다. 공감과 정서, 철학이 세계를 움직였다. 이는 조선의 문치 정신과 백범 김구의 문화주의가 지금도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지속시키고 확장시킬 것인가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이 더 깊고, 오래 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시 문화의 힘이다. 시장을 넘어 마음을 움직이고, 철학과 가치로 설득하는 힘이다. 눈앞의 경쟁을 이기는 능력보다, 다음 세대를 감화시키는 힘이 더 먼 길을 만든다.
역사학자 신채용은 “역사상 망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 말은 오늘의 한국 사회에 질문을 남긴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떤 질서를, 어떤 품격을, 어떤 사유를 다음 세대에 건넬 수 있을 것인가.
조선은 문화를 만들었고, 백범은 그 확장을 꿈꾸었으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것을 현실로 드러내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문화의 힘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어떤 형태로 다음 세대로 건넬지를 생각해야 할 때다.

ㅡ 민가, 『나그네처럼, 맨발에 각인된 흔적처럼』
언제부터였을까 모래시계에 쇠사슬을 걸고
초침 같은 눈으로 세상을 재단한 것은
숫자가 된 날들이 좌표 위에서 아득해지고
효율이란 이름의 환영을 쫓아 매혹을 수치로 환산하는 동안
해 지는 하늘은 홀로 붉은 날개를 펼치고 있었다
오늘의 마지막 증인처럼 색채의 흔적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때로 그는 질문했다
산이 가만히 앉아 천 년의 위엄을 쌓는 것이
삶을 일부러 깊고 느리게 흐르게 하는 것인지를
강물이 굽이쳐 돌아 바다에 닿는 것이
인내의 깊이만큼 자라는 찬란한 순간인지를
그는 서두르는 걸음마다 놓친 풍경들을 떠올렸다
속도에 빼앗긴 것이 그 어떤 영원인지 궁금해하면서
세월을 벗 삼은 바위가 이끼의 언어를 익히는 것을 보았다
떨어지며 가장 뜨거운 색을 드러내는 단풍처럼
그는 놓치기 전에, 그 후에도 모를 그 무엇을 어렴풋이 떠올리기도 했다
해 지는 풍경 앞에 그저 머물러 보고자 멈춰 서면서
정적의 틈에서 고개를 든 빛의 숨결, 흙의 울림, 내면의 고요를
오직 멈춘 자리에서 발견한 모든 신비가 그곳에 있는 것만 같았기에
그는 그것이 삶의 진정한 위엄일까를 생각했다
호흡의 리듬과 맞물려 흐르는 고요한 위안이
걸음마다 새긴 영원 같은 울림이 되어 주지는 않을까
살아 숨 쉬는 이 작은 세계에 소박한 증거가 되어 주지는 않을까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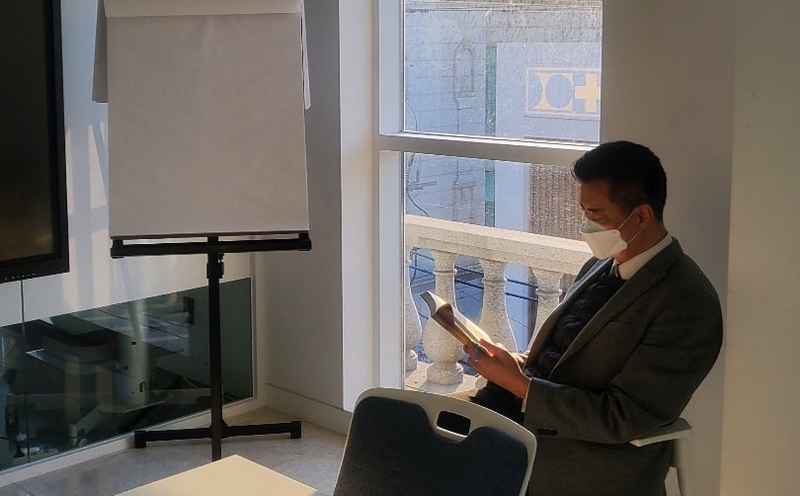
민가(民歌)
시인, 칼럼니스트, IT AI 연구원 , KAN 전문기자
문학과 기술, 사람의 이야기를 씀.

